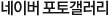|
전망대에 오르면 아!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. 눈 아래로 한강과 밤섬이 한눈에 들어오고 강 건너 풍경이 와이드스크린처럼 펼쳐진다. 왼쪽부터 63빌딩과 서강대교, 마포대교, 원효대교, 한강철교, 한강대교, 남산타워가 바라보인다. 북한산도 조망할 수 있다. 난간 바로 앞쪽으로는 미루나무, 아카시아 나무들이 우거진 울창한 숲이 펼쳐진다. 전망대를 등지고 왼쪽 편이 173번지 일대다. 효사길 5길. 아래쪽 마을과는 분위기가 딴판이다. 전형적인 골목 풍경을 보여준다. 낮은 지붕을 인 집들이 일렬횡대로 늘어서 있다. 한강대교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다 보면 왼쪽 높은 언덕 위에 머리만 내놓고 있는 집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다. “여기 집이 들어선 지 한 50년 정도 됐을까? 아마 6.25 직후 피란민들이 몰려 들어서 동네가 만들어졌을 거야.” 나무 그늘 아래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던 김창님 할머니(78)는 ‘그때 그 시절’을 이야기했다. “그때만 해도 죄다 판잣집이었지. 사는 게 지금하고는 비할 데가 아니었지. 물이 안 나와서 저기 동양중학교까지 물 뜨러 다니고 그랬어.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김 할머니의 말을 거든다. “가스와 하수관이 지난 99년인가 들어 왔어요. 지금은 그나마 살기가 많이 나아진 거에요.”
어느덧 해질 무렵이다. 야경을 찍는다고 삼각대를 세우며 부산을 떨고 있으려니 아저씨 한 분이 대문을 열고나와 요구르트를 슬쩍 내민다. 그러면서 야경 사진을 찍기에 좋은 ‘명당’이 있다며 손을 잡아 끈다. “여기가 한강과 63빌딩을 같이 찍기에 제일 좋은 명당이에요. 저기 전망대보다 훨씬 좋아요.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는 이 자리 잡으려고 난리법석이요. 2년 전인가 여기서 일몰 사진을 찍은 사람이 대상을 탔다고 그러던데 그 이후로는 안 오네요, 하하.”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퀵 서비스 청년도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며 “이런 카메라는 얼마나 해요?”하며 이런 저런 말을 건다. 청년은 전남 해남에서 올라왔다고 한다. “그나마 가진 돈으로 방을 얻으려다 보니 여기에 오게 됐네요. 몇 년 살다 보니 정도 붙고 그렇네요. 공기도 좋고 이웃들끼리도 모두 친하고. 고향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.”
흑석동 173번지에서는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. 담장 밑으로 수줍게 핀 나팔꽃, 대문 앞 화분에 탐스럽게 열린 방울토마토며 고추, 오이가 탐스럽다. 여름 뭉게구름은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다. 그리고 노을은 또 어떤지. 해질 무렵이면 적자색 노을이 마을로 슬금슬금 내려 앉는다. 잿빛벽을 물들이는 노을은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만든다. 서울 흑석동 173번지.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.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 가보시라. |